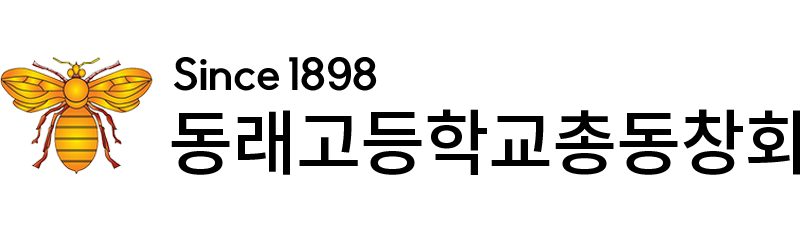자유게시판
홈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낙동강
4,545
회 오봉
2016.01.13 12:37
낙동강
이 성 호
대박을 꿈꾸는 새벽
누가 줄을 잡고 있나.
초성(初聲)의 머뭇거린 속삭임을 묻어 두고
발 뻗는 시원의 계곡
잠을 설친 황지연못
남으로 향한 걸음
멀리 앞을 바라보며
서로 다른 온도차를 눈금으로 다독이며
산모롱 초집들조차
문을 열고 반겨 맞다.
날리는 금빛 갈기
소리소리 넘던 산을
그 옛날 읽어가던 초연(硝煙)의 벌도 지나
펼쳐진 서경의 가락
굽이굽이 껴안는다.
잣대로 금을 그어
숨바꼭질 하던 생태
마음 편히 모실 그날 손꼽아 헤아리며
풀어 본 갑론을박(甲論乙駁)을
속에 넣어 보채다가
건너 온 700여길
매듭 풀어 탄탄대로
물길도 세월도 한 굽이로 모여와서
겨레의 대동맥 짚어
한바다를 열 젖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