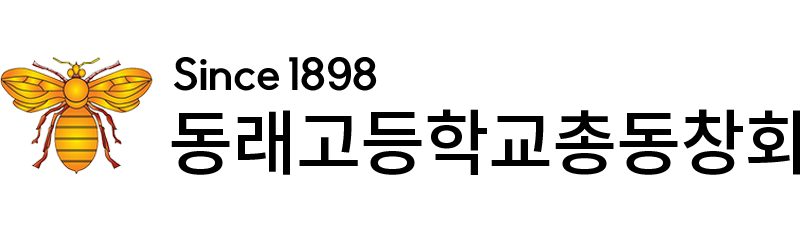자유게시판
홈 > 지역모임/동호회
> 망월산악회 > 자유게시판
숲속의 교향곡 - 수필
5,025
김진곤(36)
2005.06.27 11:56
숲속의 교향곡
김 진 곤
흙 내음. 사람은 흙을 밟지 않고 살 수 없다면 인간답게 살 수 없다. 신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즐겁다. 나는 지금 이 속에 있다. 짙은 신록의 계절에 들어선 길목에는 반갑지도 않는 여름이 한가운데 온 것처럼 무덥다. 봄은 간데없고 여름만이 무성하게 피어나고 있는 계절이다.
전국 고교 합동산행을 삼도 봉으로 가기위해 영동 물한 계곡을 들어선다. 민주지산 자락에 흐르고 있는 계곡. 이 곳을 찾아가는 길은 첩첩오지로 사방은 크고 작은 산들이 에워싸고 있고 호두나무, 감나무가 즐비하게 이어진다. 눈부신 아침 햇살이 얕은안개를 헤치고 산촌마을의 낮은 지붕위에 내려앉는다. 급하게 경사진 길모퉁이를 돌때마다 그지없이 정겨운 풍경이 안겨 든다. 둥근 돌로 쌓은 논둑의 푸른 이끼, 희고 노란 들꽃들의 눈부심, 길가에 늘어선 감나무 가로수, 계곡물 위로 퐁당퐁당 물수제비뜨는 조약돌, 잠기는 듯하다가 허공을 튕겨 오르고 다시 수면을 스쳐 거듭 솟구치면서 용트림 하는 맑은 시냇물, 물보라 사이로 은은한 고향의 향기가 뿌려지는 듯 하다.
골짜기와 산길을 따라 수십 분을 지나니 물한 계곡 매표소가 나온다. 이번전국 동창의 상봉이 다섯 번째로 모두 이곳으로 모인다. 일부는 만나는 장소인 청소년 수련관으로 일부는 산을 향하여 오른다.
계곡을 들어서니, 온 산에 함성이 울려 퍼질 산길, 울창한 숲 사이로 맑은 물이 흐르고 초여름의 따가운 햇살을 숲이 가린다. 가는 길은 녹색과 원색으로 가득 차고, 습한 지열에서 품어나는 흙 내음이 흐르는 땀에 묻어난다.
숲에 들어서서, 가만히 귀 기울이면 새들의 아름다운 합창소리가 숲속의 교향곡처럼 들린다. “짹짹 재잘재잘....” 그들의 소리가 각기 다르면서 멋진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보면 자연의 이치가 참 오묘하다. 새는 허공에 흩어진 전령사, 숲이 우거진 곳이면 누가 오라 하지 않아도 바람처럼 찾아왔다가 사라진다. 이들의 고향은 산과 숲의 향기로 어울러 진 소리로 천연의 음악이며 자연의 연주다. 예로부터 소쩍새가 ‘솟쩍’하고 울면 다음해에 흉년이 들고 ‘솟적다’고 지저귀면 풍년을 예견했다는 선조들의 해학과 지혜를 들은 적이 있다.
잠시 땀을 닦으며 쉰다. 나무의 잎 새가 하루가 다르게 변화는 모습이 마치 지나온 시절을 보는 것 같다. 지난번 모교에 갔을 때이다.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학생들 속에서 그 옛날의 나를 본다. 벚나무가 보이는 창가 쪽 맨 앞자리, 공부시간에 소설책을 읽거나, 도시락을 먹거나, 영화배우의 사진을 들여다보던 내가, 삐딱한 내 의식이 틀에 박힌 규율을 못 견뎌 하품하던 내가, 영화 이외엔 어떤 흥미도 없던 그때의 내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너무나 생생한 전경으로 떠오른 그때의 모습에 절로 웃음이 터져 나온다.
능선을 오르는 나무계단 사이로 이름모를 작은 야생화들이 무심코 지나치려는 나의 발길을 붙잡는다. 너무 작아 눈에 쉽게 띄지 않는 듯한 가냘픈 모습이다.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도심의 길거리에 피었더라면 외로움이 덜 할 덴데 말이다. 눈여겨 봐 주는 이 없는 깊은 산속에서 그리움을 안고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니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산 정상에 올랐다. 불어오는 바람에 쐬니 오르는 동안 힘든 것이 사라지는데 이런 맛에 산을 오르는 듯싶었다. 불어오는 바람이 삶의 어려운 것과 슬픔을 깨끗이 씻어 내려 주는 듯 후련하다. 힘들다고 주저앉을 수도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산행처럼 삶의 무게들을 맞이하며 나아가야 하리라.
올라온 길을 보며, 바위틈에 끈질긴 생명력으로 뿌리를 내리고 사는 소나무에 기생 풀을 보니 학창시절 생각이 난다. 그 시절 나보다 키가 크고 힘이 센 학생에게 내기로 져서 금품을 빼앗기고 고통 받던 시절이 있었다. 보복이 두려워 담임선생님께도 알리지도 못하고 불안한 나날을 보냈는데 다행히 그 학생이 다른 잘못으로 선생님께 된 호통을 당한 후에 고민으로 해방되긴 했으나 불안감으로 사로 잡혔던 그 시절의 기억을 지울 수 없다.
점심을 하고 하산을 시작 하였다. 길을 멈추고 쭉 뻗은 나뭇가지 사이로 올려다보니 짙은 녹색 잎 새 사이로 초여름의 햇살이 은빛 비늘처럼 반짝인다.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하는 지금, 따뜻한 마음과 상대를 배려해 주는 한마디 말에 힘이 되어주는 동창들, 앞만 보며 달리던 산행의 속도를 멈추고 내리 온 산길을 본다. 녹음을 뚫고 새어 들어오는 중천의 해를 보면서 끈끈한 동창 사랑의 마음을 보는 듯 하다. 산행을 마치고 모두가 영동 청소년 수련관에서 모두 만났다. 서로 반가운 얼굴로 동기간의 정을 나누는 회식자리에서 건배의 외침은 산자락을 타고 긴 여운을 남긴다. 식순에 따라 서울. 부산 동기회장의 인사말과 교가제창, 화합의 우레 같은 박수들, 동창인 만이가지는 화합의 축제 한마당은 삼도봉 골짜기에 어둠이 내리면서 끝났다.
동창들과의 합동산행, 만남과 헤어짐이 인생의 축소판을 걷는 듯하여 잠시 생각에 잠긴다. 우리네의 생활도 산이라 생각된다. 그 곳에 오르면 모든 번민을 깨끗이 씻어준다. 주어진 시간에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못 오를 산이 없어 리라. 산은 오르는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참 뜻을 가르쳐 주는가 싶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꿈을 꾼다. 해마다 깊어가는 나이테처럼 든든한 버팀목 같은 동창의 만남이 계속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