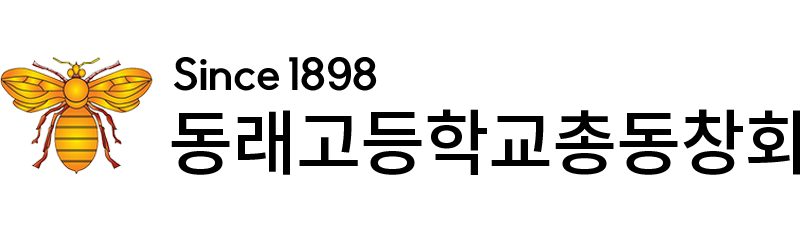자유게시판
홈 > 지역모임/동호회
> 망월산악회 > 자유게시판
녹향(綠香) - 산행 수필
4,861
김진곤(36)
2006.06.14 13:20
녹향(綠香) - 산행수필(삼육산악회)
36회 김진곤
맑은 초여름은 덥다. 무성한 숲과 바람이 살랑대는 좋은날, 신록으로 가득한 산자락에 눈이 머문다. 어제는 빗방울이 뿌리더니 오늘은 안개가 뿌옇게 끼었다. 그곳은 늘 내안에 있는 작은 동산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과 함께하는 것을 동경한다. 지나는 구름도 예나 지금이나 길이 없으니 더위도 마찬가질 꺼다. 노송들이 줄지은 능선에는 여름을 먼저 알리는 뻐꾸기 소리가 오묘한 교감을 느낀다.
잠이 깨어 활짝 연 창문으로 산자락을 본다. 옛 동래성을 감싸고 우뚝 솟아있는 마안산은 부산의 역사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문화유적이 많다. 옛 가야와 신라문화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복천고분군을 비롯해서 동래패총과 동래향교, 동래 읍성지 등이 있다. 누구나 길을 따라 숲길을 걸을 수 있는 이곳도 초여름의 녹색 향기가 곳곳에 넘실댄다.
지난 일요일, 오랜만에 몇몇 옛 교우들과 금정산에 올랐다. 남산골을 시작으로 상마부락, 용락암, 금정산성, 산성 동문, 동래 온천장 이어지는 약3시간의 산행 이었다. 며칠 전 내린 비로 풀과 나무가 말끔히 씻겨진 파란 잎들이 신록의 계절임을 알린다. 골바람을 타고 오는 초여름의 상쾌한 단내가 코끝에 묻어난다. 군데군데 꽃을 떨 구고선 산철쭉들이 소나무 숲 가운데에서 얼굴을 내밀고, 이름 모를 풀꽃들이 미소 지어며 앙증맞게 다가온다. 싱그러운 6월이다.
산행은 으레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고 평탄한 길과 암벽을 타거나 이곳을 끼고도는 산길이 있다. 목적지를 가는 것은 한 걸음한걸음은 발자국이다. 산을 오르는 것은 그저 무의미한 것이 없다. 잘못 디디면 나무에 부딪치거나 미끄러지거나 발목을 접질려 발을 다치거나 낭떠러지기에 떨어질 수도 있다. 한걸음의 산행이 살아 숨쉬는 한 호흡 호흡이 바로 천지자연의 은혜이다. 풀 한포기 돌멩이 하나, 한점바람, 어느 것 하나도 헛됨이 있던가.
숲으로 뒤덮인 남산골에는 들머리부터 계단식 밭뙈기가 있어 등산의 시작임을 알 수 있다. 논두렁길을 5분여 오르니 가파른 오르막이 시작된다. 가팔라 숨이 찬다. 남산골 상마부락을 끼고 오르는 길은 수많은 발길이 오고간 잘 다듬어 진 산길이다. 어제께 헬스를 한 탓일까 가픈 숨길에 등에는 땀이 흐른다. 산기슭 맑은 기운으로 가슴을 채울 즈음,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함께라면 나직나직 담소하며 걸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요즘 축구이야기가 화제다. 한국인의 축구사랑, 월드컵 축구에 열정이 대단하다. 지역예선부터 특집으로 한껏 바람을 잡는다. 우리의 월드컵 열기는 광적이다. 사실 축구만큼 민족성을 잘 나타내는 경기도 없지 싶다. 축구 강호국들의 기풍을 음악에 비유 한다. 아르헨티나 축구가 탱고에 비유 한다면 브라질은 삼바를, 이탈리아 축구는 몇 사람이 전체적인 작품을 만드는 오페라 비유된다. 독일은 일사불란한 교양곡이나 행진곡에 비유하고 싶다. 한국 축구의 특징은 속공 단어가 떠오른다. 국가경제발전에 빨리빨리 해치워야했던 것이 속공 플레이로 나타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제 축구를 보고 즐기는 눈도 수준 이상이어야 하고 응원도 한 단계 올라가야 할 때다. 우리의 축구 사랑도 속공 플레이가 아닌 선방에 앉아 가야금 선율에 울려 퍼지는 느긋함이 필요한 때이다.
30여분을 길에 취해 오르면 남산골 뒷산 정상에 오른다. 눈앞이 확 트이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한눈에 들어온다. 구서동, 남산동은 물론 멀리 수영, 광안대교가 보이고 멀리 마안산자락에 ·나의 동네가 아스라이 보인다. 언제나 편안한 날이 없는 사람들의 삶이 보인다. 여기에서 잠깐 거리를 두고 세속을 떨어져 보게 하는 것은 삶의 집착을 떼놓고 보라는 것일까. 잠시 생각에 젖는다.
발을 내디디니 능선 길은 고즈넉해지면서 경사를 줄이고 평온해진다. 삐 따닥한 사립문 기둥에 용락암이란 작은 나무패가 걸려 있다. 숨을 크게 들어 쉬고 오솔길을 들어서면 작은 개울물을 만난다. 아직도 못다 씻은 속진을 닦아내라는 뜻일까. 흐르는 물소리가 마음을 적신다. 10여분 가파른 길을 올라 지능선에 오르니, 산성마을로 가는 길과 산성북문으로 가는 갈림길에서 하산하는 동문(東門)으로 발길을 옮긴다.
길 왼쪽 바위위에 망월정이 있다. 보통 때는 지나치는 곳이지만 선두가 길을 안내한다. 새로 깨끗하게 세운 듯한 단청이 정겹다. 내려다보니 해동수원지 주위를 감싸고 있는 나즈막한 산들이 정겹게 드리워 있고 따개비처럼 붙은 고층아파트, 빌딩, 집들이 있는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누구든 높은 곳에 올라야 먼 곳을 볼 수 있지 싶다.
하산하는 고즈넉한 둔덕길 따라, 키를 낮춘 풀 더미를 가볍게 밟으며 가끔씩 빗물에 속살을 드러낸 맨 흙길을 밟기도 한다. 아무렇게나 깔려있는 크고 작은 돌 더미가 경치를 더한다. 밧줄이 처진 등산길로 나오니 사람들의 행렬로 세상이 어지럽다.
풀 섶을 헤치고 걸었던 길, 그리운 사람들과의 산행 이였기에 즐거운 하루였다. 자연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마음, 땅을 아끼기를 어머님의 살같이 하라는 옛 어른신의 말씀이 아로새겨진다.
2006. 6. 11. 씀